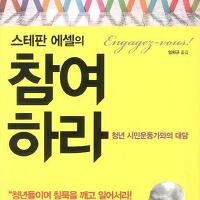출퇴근 길에 지나는 아파트 단지 울타리에 붉은 장미가 피었다. 꽃집에서 파는 봉긋한 장미가 아니라, 꽃잎을 최대한 펼쳐보이는 새빨간 들장미다. 이 장미가 피는 걸 보니, 초여름이다. 시간도 멈추고 삶도 멈춘 것처럼 느껴지더니 그 장미의 색이 너무 붉었던 모양인지 그래도 시간은 흐르는 구나, 라고 체념처럼 헛헛한 말이 새어나왔다.
박완서의 단편소설을 엮은 <그리움을 위하여>(문학동네, 2013)에 <빨갱이 바이러스>라는 단편이 들어 있다. <기나긴 하루>라는 단편집에서도 읽었던 기억이 난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깊이에의 강요>에 '문학적 건망증'이란 에세이를 읽었던 기억이 난다. 역시나 그 말처럼, '문학적 건망증'이란 단어만 살고, 나머지는 기억 저편에 있다. <빨갱이 바이러스>라는 글도 읽었던 기억만 있을 뿐 내용을 재생해보라 하면, 기억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읽었을 때의 충격과 아픔과 씁쓸한 이미지는 뇌리에 남았다. 일단 제목부터 강렬하지 않은가. 바이러스라는 말은 대개 사람을 병들게 하는 이미지니까.
강렬한 태풍이 휩쓸고 간 강원도의 시골마을. 중년을 넘어선 여성인 주인공은 노모의 시신을 찾지 못하는 친구를 따라 고향에 왔다가 자신의 친정집(지금은 자신이 돌보는 집)으로 가던 길에 낯선 세 여자를 차에 태우고 자신의 (친정)집에서 하룻밤 묶게 해주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소설은 그들의 인생 고백을 듣다가 결국 주인공의 '어떤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세 여자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건, 아마도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란 전제가 필요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주인공이 만난 세 여자의 인생은 가족들이 상처로 남았다. 소아마비를 앓은 것처럼 보이는 여성과 몸 구석구석에 뜸을 떠야 할 만큼 아픈 사람으로 보이는 여성과 불심이 지극해 수행을 할 것 같은 보살 여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뿐 그들의 실체는 아니다. 아예 틀렸다.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폭력 혹은 그 가족들에게 스스로가 저지른 죄악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에게 시달리다 성폭행 위험이 처하자 3층 난관에서 뛰어내린 여성, 장애가 있는 아이를 시설에 버리고 남편이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의 몸에 담뱃불을 지져대는 여성, 어린 손자를 키우다 손자의 영어선생님과의 욕정에 눈이 멀어 방심한 사이 손자가 죽어버린 여성. (이렇게 몇 개의 문장으로 정리했지만 이들의 삶이 이 문장들에 다 채워진 것은 아니다.) 소설이라지만, 이렇게 소설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한데 모일 수 있을까.
주인공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지만 그에겐 도덕적 강박증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마음 속 깊은 죄책감에 대한 신호이고, 그것을 덮어버리고자 하는 자신의 또다른 면이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전엔 북한 땅이었다가 휴전 이후엔 남한 땅인 자신의 어린시절의 집. 인민군이었던 삼촌이 다시는 그 집에 오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된 어느날 밤의 사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족상잔'의 범죄를 저지른 밤, 그 범죄를 묵인했다는 걸 최후에 알게 된 자신. 주인공과 세 여자는 하룻밤 같이 지내며 깊은 내막을 주고받으면서도 서로의 신분을 알리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것을 털어놨기 때문일까, 그들은 한결 가벼운 아침을 맞이했다.
어떤 아픔과 폭력을 듣기만 해도 자신의 몸에 내재된 바이러스가 반응해 곧 나타나는 것, 그것이었다. 그래서 상대가 처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지만, 그들의 아픔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기 안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것. 그것은 치유할 수 없는, 바이러스와 같았다. 글도 마찬가지 아닌가. 분명히 다 잊어버렸는데, 비슷한 문장만 보아도 같은 감상을 되살리는 것. 시간도 마찬가지 아닌가. 분명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비슷한 공기만 느껴져도 같은 시절을 되살리는 것. 이 폭력의 시절이 두고두고 아픔으로 남아, 또다른 폭력과 만날 때 되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지독한 바이러스가 되기 전에 무엇이라도 해야 하지 않은가. <빨갱이 바이러스>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다.
"폭력을 삼킨 몸은 목석같이 단단한 것 같지만 자주 아프다."
엄혹한 시절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그 폭력을 만든 이들의 잘못이라고 말하고도 싶지만
그럼에도 그 폭력을 묵인했던 자의 고백이다.
'알음알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떠나기 위해선 돈과 용기가 필요했다” (0) | 2014.08.03 |
|---|---|
| 스테판 에셀 <참여하라> (0) | 2014.07.09 |
|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0) | 2014.03.27 |
| 도시 심리학 : '도시인으로' 살기에 대한 이해 (0) | 2014.03.23 |
| 당분간 인간 -"사실 부스러기도 좀 떨어져" (0) | 2014.03.15 |